|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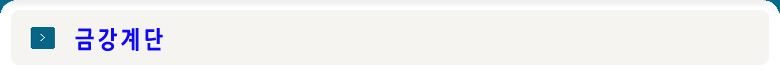 |
|
|
|
| 토끼풀꽃의 노래 |
이진영
시인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永遠)히 슬플 것이요.
윤동주 시인의「팔복(八福)」이라는 시다.
성경 마태복음 3~12장을 패러디해서 쓴 시다.
마음이 우울하고 외로울 때면 나는 가끔이 시를 음미한다. 마음으로 이 시를 가만히 음미하고 있다 보면 뭔가 모를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때문이다. 특히 마지막 행인‘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라는 구절은 삶의 어떤
희열마저 맛보게 한다.
그러나 이 시는 실은 일제 식민치하의 압제와 박해에 항거하기 위해 쓴 시다. 윤동주 시인은 몸과 마음과 사상과 말이 묶인 어둠의 그늘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일본 제국주의가 무너지고 말 것이라며‘저희가 영원히 슬
플 것’이라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었던 것 이다.
오늘 내가 이 시를 되뇌어보는 것은 요즘 내 마음상태가 그렇기 때문이다. 이 시처럼 앞으로 나는 당분간 더욱 외로워지고 슬퍼질 것 같다. 국민 탤런트 최진실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도 나는 참을 수 없는 외로움과 슬픔으로 통점(痛點)의 절벽을 서성거렸다. 그런데 이번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투신이 나의 그 외로움과 슬픔의 통점에 장작불을 지핀 것이다.
그래도 이렇게 허물어져선 안 되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 참석한 다음날 아침 일찍 나는 제주도로 날아갔다. 눈썹마다 걸리는 제주바다 수평선과 한라산 오름들이 내 우울의 통점을 조금이라도 가라앉혀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체 이 무슨 운명인가. 아침을 먹기 위해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식당(유리네집)에 갔는데 거기서 다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게 될 줄이야. 아니‘야인 노무현’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1997년 6월 28일‘야인 노무현’은 이곳에서 갈치구이를 먹었나 보다. 영정처럼 노란색 종이국화꽃으로 사방 테두리를 두른 A3 크기의 종이 위에‘촌놈 노무현’은 다음과 같이 썼다.
‘갈치구이. 어린 시절 생각이 난다. 제주에서 고향을 느낄 줄이야. 97. 6. 28. 노무현’ 그것을 보니 다시 외로움이 사무쳐왔다. 목구멍이 뜨거워졌다. ‘어리숙한 촌놈’노무현을 죽도록 사랑해서도 아니고, ‘바보’노무현이 환장하게 그리워서도 아니다. 서민적인, 너무나 서민적인,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의 삶의 궤적을 제주도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 문득 떠오른 시가 바로 윤동주 시인의「팔복」이었던 것이다. 마치 내가 꼭 그 시 속의 주인공인 것 같았기 때문이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우울의 통점을 짓누르기 위해 푸로작(항우울제)과 자낙스(항불안제)와 인데놀(신경안정제)을 입안에 한 움큼 털어 넣고 한라산으로 향했다. 그런데 아뿔싸. 오전 10시가 넘고 나니 입산이 허락되지 않았다. 하절기 입산 제한 시간이 오전 10시까지라는 것이다. 이런 젠장. 20분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백록담으로 통점을 씻으러갈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다.
절 구경도 할 겸 하는 수 없이 관음사가 있는 아미오름(봉)이라도 오르기로 했다. 관음사 일주문에 들어서자 머리에 수미산 돌삿갓 을 무겁게 인 현무암(화산석) 돌하르방 불보 살님들이 길 양쪽으로 쭉 도열해 있었다. 열 병하듯 그 사잇길을 걷다보니 불쌍한 중생인 내가 외려 불보살님께 환영받는 손님인 것 같았다.
그 가피 때문일까. 하루 꼬박 아미오름을 돌아다니다가 내려왔어도 전혀 지치지가 않았다. 지루하지도 않고 우울의 통점도 많이 가라앉았다. 대신 진한 허기가 몰려왔다.
제주 여자들은 여자이되 남자들보다 훨씬 싹싹하고 씩씩하다. 내 허기를 어떻게 알아챘는지 관음사 종무소 앞 불교용품 코너를 담당 하고 있는 여자분이 대뜸 말을 건넸다.
“떡 꿈 먹읍서.”
“……?”
무슨 말인지 몰라 멀뚱해있는데 여자분이 킬킬 웃으며 다시 말했다.
“배고프면‘떡 좀 드세요.’라는 말입니다.”
히힛. 우습다. 제 나라 사람이 제 나라 사람의 말도 못 알아듣다니.
그래도 내가 명색이 국어국문학과 출신인데, 그리고 학부시절 제주 도 방언에 대해서도 꽤 배웠는데 통역해주지 않으면 한 마디도 제주도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니.
저물녘 하산 길에 보 니 관음사 주변 곳곳에 토끼풀꽃이 하얗게 깔려 있었다. 올라갈 때 못 본 꽃을 내려올 때 보게 된 것이다. 그 토 끼풀꽃을 보니 어린 시절이 생각났다. 동네 친구들과 그 토끼풀꽃으로 꽃시계와 꽃반지 를 만들어 서로의 팔목과 손가락에 채워주고 놀았던 기억이 삼삼하게 떠올랐다. 그 순간 나도 문득‘어리숙한 촌놈’이 되어 한 마디 남기고 제주바다 수평선 아래로 하산했다.
‘하얀 토끼풀꽃, 제주도에서 나의 어린 고향을 만날 줄이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