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순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원묘국사 요세 스님
원묘국사(圓妙國師)로 추증된 요세(了世,1163-1245) 스님은 일생 동안 참회행을 발원한 분이다. 요세 스님은 세속 나이 83세를 향유했는데 36세 전후하여 기도를 시작하였고, 이후 임종에 이르기까지 45년 간 쉬지 않
고 예불과 염불, 주송(呪誦)과 경전독송을 병행하신 분이다. 그 행법의 목적은 불국정토의 구현이었다. 사망 후에 왕생(往生)하는 정토가 아니라 현실을 불국토로 만들고자 염원하는 유심정토관이다.
비문에 나타난 요세 스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참회와 기도의 생애를 알아본다. 요세 스님은 지금의 합천인 강양군에서 출생하였다. 12세에 균정대사에게 출가하여 천태학을 배웠다. 당시 뛰어난 실력 때문에 통치하던 군수도감탄하였다. 그는 10년 간 교학을 갈고 닦아 승과에 급제하였고 당시 천태교단의 미래를 짊어질 유망주로 명망이 자자하였다. 그럼에도 그는 이후 교학과 실천에만 매진하며 10년을 보냈다.
참회 기도의 발단
1198년 혼탁한 세상을 바로잡고자 개경(개성)에서 대법회가 개최되었고 요세 스님은 그법회의 단상에 올라 법문을 했다. 그러자 의견이 분분했던 좌중이 요세 스님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 조용해졌다. 당시 불교 내부는 물론 교단과 정치의 결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고, 요세 스님은 이러한 현실을 비판했던 것이다. 그 해 스님은 세상을 등졌고 도반들과 함께 본래의 불교수행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장연사에서 참회 정진을 시작하였다.
원묘국사(圓妙國師)로 추증된 요세(了世) 스님은 일생 동안
참회행을 발원한 분이다. 그 행법의 목적은 불국정토의 구현이었다.
사망 후에 왕생(往生)하는 정토가 아니라
현실을 불국토로 만들고자 염원하는 유심정토관이다.
수선사에서도 참회기도를
이 때 팔공산에서 대중들과 함께 불교계와 정치계가 정화되기를 갈망하면서 수선사(修禪社)의 정진을 시작했던 지눌 스님은 요세스님의 개경 대법회 소식과 장연사에서의 참회기도 소식을 듣고 그를 초청하였다. 요세 스님은 지눌 스님의 서신을 받고 공산의 수선결사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요세 스님은 수선사에서도 선법이 아닌 천태종 전통의 예불과 참회 기도를 지속하였다. 그것도 낮과 밤에 걸쳐 지극한 마음으로 예불을 모셨다. 그러자 그들은 요세 스님을 일컬어‘서참회’라고 불렀던것이다.
지눌 스님이 공산에서 지리산 쪽으로 향하자 요세 스님은 그를 따르지 않고 남원의 귀정사에 멈추었다. 귀정사 주지 스님은 간밤에 꿈을 꾸었다. 삼생(三生)의 법화스승이 지나가니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라는 것이었다. 과연 요세 스님이 도착하였다. 이로써 요세 스님은 조계선이나 < 화엄경> 을 지향한 것이 아니라 < 법화경> 과 천태종의 가르침과 행법을 지향하는 승려임을 알 수 있다.
오로지 참회기도가 수행자의 병을 제거한다.
요세 스님은 월출산 약사난야(藥師蘭若)에 머물다가 문득 생각하다가 혼잣말로‘ 영명연수 스님이 말씀하신 수행자 120병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것은 선종의 간화선법으로는 고치기 어렵다고 본것이다. 그렇다면 천태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참회법이 그 대안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 때까지 자신이 행했던 예불과 참회의식에 대한 교리적 바탕이 필요했다. 요세 스님은 < 묘종초> 가 그 대안이라고 보았다. 본래 천태대사의 < 관무량수경소> 인데, 송대의 지례스님은 이를 해석하여 < 관무량수경소묘종초> 라 이름 했다. 요세 스님은 이 < 묘종초> 에 근거를 두고 참회기도를 시작했던 것이다. <묘종초> 는 상근기뿐만 아니라 하근 기도 얼마든지 성불할 수 있다는 천태행법의 이론서이다.
46세 때부터 요세 스님은 참회 예불과 기도의 행법을 지속했다. 53불께 하루 12번씩 예불하는 것이었다. 당시로서는 볼 수 없었던 참회 행법이었고, 선종 스님들도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일지라도, 아무리 더운 여름일지라도 한 번도 거르지 않았으니 그를‘서참회’라고 별명 짓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강진 만덕산과의 인연
월출산 약사난야에서 모진 참회행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널리 퍼졌고 많은 스님들이 몰려들었다. 그러자 탐진현(강진)의 토호이자 불자인 최표,최홍, 이인천 등이 요세 스님있는 곳으로 와 요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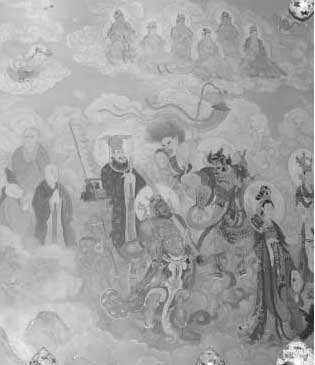 현재의 약사난야는 협소하고 대중 숫자가 많으니 탐진의 만덕산 절터에 와서 불사를 일으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를 허락하고 요세 스님은 제자들을 보내 절을 짓도록 하였다.
현재의 약사난야는 협소하고 대중 숫자가 많으니 탐진의 만덕산 절터에 와서 불사를 일으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를 허락하고 요세 스님은 제자들을 보내 절을 짓도록 하였다.
80칸이 되는 당우를 지었는데 4년이나 걸친 공사였다.
그러나 만덕산의 가람 불사의 낙성 이루고서도 곧바로 향하지 않았다. 참회 결사를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결사를 진행할 인재들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요세 스님의 결사 목표는 개인과 대중의 참회를 통한 불국정토의 구현이다. 백련사가 참회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 영향으로 사회와 국가가 맑아지기를 기원했던 것이다. 좌선행위가 아닌 참회와 예불을 통한 보현도량 운동이다.
요세 스님의 정토관은 왕생이 아닌 현실 국토의 정토화이다.
요세 스님의 신통력
요세 스님에 대한 신기한 소문이 많았다. 앞서 보았던 귀정사 주지스님의 현몽이라든지, 화장암에서 참선하면서 마구니를 항복시켰다든지, 용암사 도인 희량이 요세 스님을 기다리는 꿈을 꾼다든지, 산신이 절터를 가리켜주는등 신비스런 일들이 일어났다. 요세 스님은 임종을 맞아서도 입적 시기를 조절하는 등 신통력을 발휘했음을 보인다.
또 한 가지는 요세 스님의 도가 높다는 소문을 듣고 대방(남원) 태수인 복장한이 와서 요청한 일이다. 대방 근처 백련산에 도량을 개설해달라는 것이었다. 요세 스님이 가보니 물이 없어 가람불사가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그래서 돌아서려는 곳에 돌부리 하나가 있었고, 요세 스님은 이 돌을 잡아당겼다. 돌부리가 빠지면서 샘물이 용솟음쳤다. 요세 스님은 이를 괴이하게 여기고 불사를 일으키고 몇 년 간 정진하였다. 그러자 만덕사의 최표 등이 요세 스님에게 와 줄 것을 다시 요청하였다. 요세 스님은 이를 허락하고 만덕사에 들어가 승려와 불자들을 모아 행법도량을 열었다.
백련사 결성과 대중 참회기도
만덕사 도량이 열리자 많은 불자들과 승려들이 운집하였다. 요세 스님은 이전에 경험했던 지눌의 조계선과 같이 참회 기도의 결사를계획하였다. 마침내 1228년 과거에 급제했던 젊은 학도들이 벼슬길을 포기하고 요세 스님에게 왔다. 스님은 이들에게 < 법화경> 과 천태 행법을 가르쳤으며 참회행의 결사를 진행하였다. 이 때 승려가 되었던 유생들은 나중에 정명국사, 진정국사가 된 이들이다. 이들이 참회기도의 결사를 주도하였고 결사 이름은 백련사(白蓮社)라 하였다.
인근의 불자들은 물론 중앙과 지방의 관리들 동참하여 많은 사부대중을 이루었고, 여법하게 참회법을 행하였
다. 백련사는 지눌 스님의 수선사(修禪社)와 함께 고려 후기 결사운동의 대표적인 신앙운동이며, 국가와 불교계를 정화하는 목표를 가진다.
요세 스님은 만덕사의 결사를 보현도량의 성격으로 규정하고 천태종의 사상과 행법을 그대로 계승했음을 천명하였다. <법화경>을 독송하며, 사종삼매의 행법으로서 염불과 좌선을 동시에 행하였다. 그리고 육시예불과 준제주(准提呪)의 주송 등과 함께 천태종의 사상과 실천이 보현도량의 배경이었다. 승려와 지식인 등 상근기의 불자들보다오히려 저열한 근기의 대중들을 향한 결사운동이었다.
불국정토의 염원
요세 스님의 결사 목표는 개인과 대중의 참회를 통한 불국정토의 구현이다. 백련사가 참회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 영향으로 사회와 국가가 맑아지기를 기원했던 것이다. 좌선행위가 아닌 참회와 예불을 통한 보현도량 운동이다. 요세 스님의 정토관은 왕생이 아닌 현실국토의 정토화이다. 극락정토가 아니라 심정토를 지향한 것이다. 임종 이후에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이 아니라 참회를 통해 마음을 맑히면 그것이 곧 정토로 보았다. 이를 뒷받침하는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83세가 된 요세 스님은 병이 들었고 곧바로 사람을 시켜 대나무 좌선방석과 선상(禪床)을 만들도록 하였다. 요세 스님은 그 방석 위에서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했으며, 증성게를 외우고 또한 좌선 및 < 법화경> 을 독송하였다. 임종에 이르러서도 참회행과 정토를 발원한 것이다. 대나무 선상이 곧 극락정토이며, 사바세계가 그대로 불국토임을 증명시키는 일화이다. 묘종초뿐만 아니라 천태종의 정토사상이 유심정토인 것이다. 따라서 제자인 정명국사는 스승의 임종 직전에‘선정(禪定)에든 마음이 곧 정토인데 어딜 가시나이까?’하자, ‘도란 결코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의 정토관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요세스님은 참회와 기도를 통해 마음을 맑혔고, 평생 극락정토에 살다가 가신 분이다.







